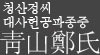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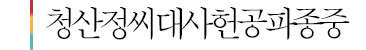 |
 홈 > 문중 뿌리 알기 > 성씨의 유래 홈 > 문중 뿌리 알기 > 성씨의 유래
|
|
靑山鄭氏의 유래
1. 시조: 정금강[鄭錦綱]
2. 본관 및 시조의 유래
청산정씨(靑山鄭氏)는 고려 말에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였으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朝鮮開國)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으로 좌의정에 올라 청산군에 봉해진 정금강(鄭錦綱)을 시조로 하고 있다.
평장사는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속했던 정2품의 관직으로 문하시랑(門下侍郞)이라고도 불렀다. 고려 성종 때 3성6부(三省六部)의 관제가 확립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며, 문종 때 품계는 정2품이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강요에 의해 관제가 격하될 때 중서시랑평장사와 합쳐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로 개칭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本貫)을 청산(靑山)으로 하여왔으나 선계(先系)가 실전(失傳)되어 대사헌공파(大司憲公派)는 가선대부,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연산군에게 직간을 하다가 종성부교수(鍾城府敎授)로 좌천된 정운결(雲潔)을 중시조 1세조로 하였고, 참의공파(叅議公派)는 이조참의(吏曹參議) 휘(諱) 유항(惟恒)을 중시조 1세조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대사헌공파는 낭천현감(狼川縣監)을 지낸 2세 정희한(希漢)의 대(代)부터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도 춘천시에 터를 정하고 거주하였다. 조선시대 현감(縣監)을 지낸 정희한(希漢)을 비롯하여 주부(主簿)를 지낸 정필(弼), 목사(牧使)를 지낸 정익(翼), 교위(校尉)의 정여해(汝楷), 부사과(副司果)의 정문우(文祐), 판관(判官)을 지낸 정효성(孝誠)등 관직자를 배출했다.
정빈(斌)은 곽산군수(郭山郡守)를 지냈고, 정종주(宗周)는 부호군(副護軍)을 지냈으며, 정봉상(鳳祥)은 호조정랑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정여흠(汝欽)은 경서에 밝아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자는 정응길(鄭應吉, 1603 癸卯生):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정화제(鄭華齊, 1645 乙酉生): 무과(武科) 현종13년(1672) 별시 병과(丙科), 정세민(鄭世民, 1604 甲辰生): 무과(武科) 인조14년(1636)별시 병과(丙科) 등 모두 3명이 있다.
참의공파는 4세 봉화현감(奉化縣監) 정원필(鄭元弼)의 대(代)부터 전북(全北) 완주군(完州郡) 비봉면(飛鳳面)에서 살다가 일부가 9세 정우삼(鄭友三) 이후에 익산군(益山郡) 동면(東面) 등지로 옮겨 갔으며, 그 후 전북 완주군 비봉면, 익산군 팔봉면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본관 청산은 충청북도 옥천군에 위치하는 지명으로 본래는 신라 굴산현(屈山縣)이었다. 1414년(태종 14) 황간현(黃澗縣)과 합하여 황청현(黃靑縣)이라 하였으나, 후에 다시 분리해서 청산현으로 복구하였고,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청산군으로 승격하였다가 1914년 행정지역단위 통폐합으로 옥천군에 편입되었다.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청산정씨는 1985년에는 총 867가구 3,656명, 2000년에는 총 1,135가구 3,7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3백여 가구, 1백여 명이 늘어났다. 1985년 당시 전국의 각 지역별 인구 분포는 서울 896명, 부산 101명, 대구 38명, 인천 115명, 경기 649명, 강원 1,217명, 충북 30명, 충남 86명, 전북 308명, 전남 99명, 경북 22명, 경남 88명, 제주 7명이다.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전북지역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1900년대의 집성촌
-강원도 춘천시 남면, 서면 현암리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초현리, 공근면 삼배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전북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전북 익산군 팔봉면
3. 세거지(世居地)의 변천(變遷)
임술보(壬戌譜)에 의하면 청산정씨(靑山鄭氏)는 낭천현감(狼川縣監)을 지낸 중시조 2세 정희한(鄭希漢)의 대(代)부터 춘천시(春川市)를 비롯한 강원도 춘천시에 터를 정하고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주부공파(主簿公派)는 대사헌공파 5세(世) 정휴상(鄭休祥)의 대를 전후하여 춘천시 남면에 자리 잡았으며, 일부자손들은 대사헌공파 9세 정석겸(鄭碩謙) 이래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정착하였고, 대사헌공파 10세 정두경(鄭斗庚) 이래로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 이주 했으며, 대사헌공파 8세 정득강(鄭得江) 이래로 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등지에 정착(定着)하였다.
사간공파(司諫公派)는 4세(世) 정여해(鄭汝楷)의 대부터 춘천시 서면에서 살았으며. 부사공파(府使公派)는 춘천시 신동면과 정지기(鄭之基) 이래로 양구군 남면 등지에 나뉘어 정착하였다. 한편 통덕랑공파(通德郞公派)는 춘천시 일원에 많이 살았다.
참의공파 (봉화공파)는 4세 정원필(鄭元弼)의 대부터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서 살다가 일부가 9세 정우삼(鄭友三) 이후에 익산군 동면 등지로 옮겨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930년 이후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강원도 춘천시 남면, 서면, 횡성군 청일면, 공근면, 전북 완주군 비봉면, 익산군 팔봉면 등지에서 집성촌을 이루었다.
|
|
|
|
|
|
|
|